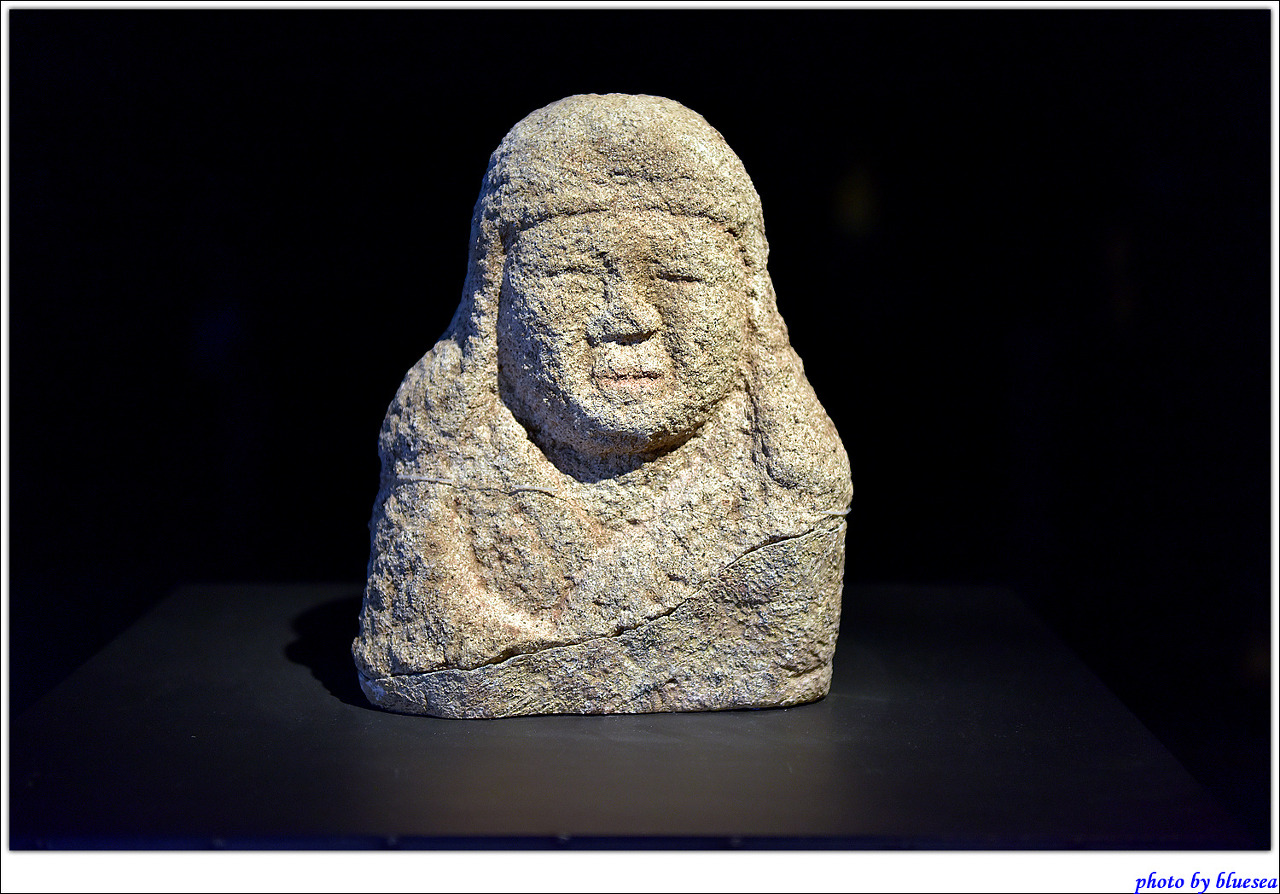|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부여박물관
- 각연사
- 효자각
- 효자문
- 보성오씨
- 법주사
- 선돌
- 공주박물관
- 사과과수원
- 단지주혈
- 공산성 선정비
- 청풍문화재단지
- 상당산성
- 오블완
- 경주김씨
- 국립청주박물관
- 한독의약박물관
- 청주박물관
- 화양동 암각자
- 문의문화재단지
- 사인암
- 화양구곡
- 문경새재
- 곡산연씨
- 바람따라 구름따라 가는길
- 충주박물관
- 부도
- 충북의 문화재
- 티스토리챌린지
- 밀양박씨
- Today
- Total
바람따라 구름따라 가는길
이월면 사곡리 김덕숭효자문(梨月面 沙谷里 金德崇孝子門) 본문

진천군 이월면 사곡리 사미마을 끝에 자리하고 있는 강릉인 김덕숭의 효자문입니다.
효자문 옆에는 김덕숭의 아버지인 김천익(金天益)의 비석이 있습니다.


조선 세종 때의 효자 김덕숭(金德崇, 1373∼1448)의 효행을 기리기 위하여 1633년(인조 11)에 세운 효자각이다.
세종이 눈병 치료를 위해 초정에 들렸을 때, 그의 효행을 듣고 충청감사를 통해 백미(白米) 10석(石)을 내렸다. 이에 김덕숭이 아버지를 모시고 세종을 찾아 인사를 드렸는데 세종은 누가 아버지이고 누가 아들인지 몰랐다고 한다. 1448년(세종 30) 그가 세상을 떠나자 세종은 이조참의에 증직(贈職)하고 어제시(御製詩) 3수를 내리면서 정려를 세우게 하였다.
그의 효행은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에 실려있다. 김덕숭은 대흥군수를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와 부모를 극진히 봉양하였고, 아버지가 잉어가 먹고 싶다고 하여 여계소(女溪沼)에 앉아서 기도를 드리니 잉어가 튀어나오고, 꿩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손가락을 펴 들에 서 있으면 꿩이 날아와 앉았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김덕숭의 효행을 기리기 위하여 ‘효는 백행(百行)의 근원’이란 뜻의 백원정(百源亭)이 세워졌고, 백원서원(百源書院)에 배향(配向)되었다. 진천군 문백면 평사리의 묘소에는 어제시를 새겨 놓았고, 입구에 신도비가 있다.
효자각은 사방 한 칸의 겹처마 맞배지붕 목조기와집이다. 옆면은 풍판(風板)으로 막고, 4면은 홍살을 둘렀다. 처마 밑 가운데는 임헌회(任憲晦)가 짓고 전우(田愚)가 쓴 정려기(旌閭記)가 있다. 편액 외에 효자비가 따로 있다. 정려는 현재 진천군 이월면 사곡리 사지 마을 안쪽 끝자락에 있다. 효자각 앞에 일각문을 세웠으며, 주위에는 아버지 김천익(金天益)의 묘와 숭모비(崇慕碑)가 있다.
효자비는 방형의 대좌에 40×103×23㎝ 크기의 비석을 세웠다. 비의 앞면은 “효자증통정대부이조참의김덕숭지려(孝子贈通政大夫吏曹參議金德崇之閭)”, 뒷면은 효행기를 적었다.
진천 김덕숭 효자각은 일반적인 형식을 따르고 있으나 『삼강행실도』에 실릴 정도의 뛰어난 효행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의 자취를 엿볼 수 있는 유적으로 가치가 있으며, 이와 관련된 백원정과 백원서원 등 다수의 유적이 전한다.

세종실록103권, 세종 26년 3월 13일 계해 1번째기사 1444년 명 정통(正統) 9년
효성이 지극한 전 한산 군사 김덕숭에게 술과 고기를 내리다
진천 현감(鎭川縣監) 김숙(金潚)에게 유시하기를,
"이제 들으니, ‘본현(本縣) 사람 전(前) 한산 군사(韓山郡事) 김덕숭(金德崇)의 부친이 나이가 95세이고 처모는 나이가 85세이며 덕숭의 나이도 70이 넘었는데, 한집안에 맞아서 두고 봉양하기를 심히 근실하게 한다.’ 하니, 내가 그 효성을 가상하게 여겨 특별히 술과 고기를 주노니 네가 이것을 받아 가지고 전하여 주어서 아침과 저녁의 봉양에 쓰게 하라."
하고, 또 충청도 관찰사(觀察使)에게 쌀 10섬을 주라고 유시하였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상신하기를,
"전 지한산군사(知韓山郡事) 김덕숭(金德崇)은 검교 한성(檢校漢城) 김천익(金天益)의 아들인데, 어버이를 위하여 직(職)을 사면하고 진천(鎭川)에 돌아가 봉양하여 곁을 떠나지 않고, 매양 좋은 때를 만나면 반드시 잔치를 베풀어 손님을 청해서 부모를 위로하여 기쁘게 하고, 어미 김씨(金氏)가 84세에 죽었는데, 그때 덕숭의 나이 62세로서 뫼 곁에 여막을 짓고 애통해 하면서 조석전(朝夕奠)을 마치고는 곧 집으로 돌아와서 그 아비에게 정성(定省)하되, 뫼까지의 거리가 2리(里)쯤 되는데 상장(喪杖)을 짚고 걸어서 왕래하기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폐하지 않았으며, 복(服)이 끝나매 집에 돌아와서 더욱 슬퍼하면서, 아비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봉양하기를 더욱 지극히 하였으며, 또 장모를 집에 맞아다가 섬기기를 어미 같이 하니, 온 고을이 창찬하고 탄복하되 아무도 달리 말하는 이가 없었으며, 갑자년 7월에 천익이 죽으매 어미의 무덤에 합장하고는, 또 뫼 곁에 여막을 짓고 모시면서 잘 때에는 요와 이불을 깔고 덮지 아니하고, 끼니로는 밥과 국을 갖추지 않고 죽을 마시고서 거적자리에 누워 있고, 지팡이를 짚고라야 일어나니, 향당(鄕黨)에서 애처롭게 여기어 말리니, 덕숭이 말하기를, ‘아비를 땅속에다 묻어 놓고 집으로 돌아가서 먹는 것은 차마 할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내가 이미 양친을 잃고 나이 칠십이 넘었으니, 억지로 세상에 살아서 다시 누구를 위하겠는가. 비록 뫼 곁에서 죽더라도 한이 없다.’ 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뫼 앞에 곡하고 날이 어두워지면 등불을 켜고 시좌(侍坐)하여 밤중에 이르렀으며, 최복(衰服)을 벗고 집에 돌아오매, 부모가 평생에 거처하던 것을 보고는 문득 눈물을 흘리며 울어 목이 메었으며, 빈 자리[虛座]를 공경하기를 살아 있을 적같이 하며, 매양 뜰을 지나려면 반드시 잔걸음으로 하며, 또 신주(神主)를 받들어 섬기기를 생시와 같이 하여, 새벽과 저녁에 반드시 절하고, 초하루와 보름에는 반드시 제사하며, 속절(俗節)에도 또한 시식(時食)을 드리니, 향리(鄕里) 사람들이 탄복하였는데, 무진년 여름에 죽었나이다. 덕숭의 효행이 특이하나 이미 죽어서 포상(褒賞)을 받지 못하였으니, 비옵건대, 그 아들을 벼슬시키어 뒷 사람들을 장려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아들은 귀식(貴識)과 귀시(貴試)이었다.

정려문에는 효자증통정대부이조참의행통훈대부한산군수강릉김덕숭지문( 孝子贈通政大夫吏曹參議行通訓大夫韓山郡守江陵金德崇之門)이라 적힌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문백면 평산리 김덕숭묘지(文白面 平山里 金德崇墓地)
김덕숭의 효행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이미 효행으로 1448년(세종 30) 명정되었고, 1633년(인조 11)에 이월면 사곡리 사지 마을에 효자문이 세워졌다. 김덕숭은 부모를 공양하는데 정성을 다
king6113.tistory.com









'충북의 바람소리 > 진천군(鎭川郡)'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진천읍 산척리 이경선충신문(鎭川邑 山尺里 李慶善忠臣門) (0) | 2025.03.29 |
|---|---|
| 문백면 평산리 김덕숭묘지(文白面 平山里 金德崇墓地) (0) | 2025.03.28 |
| 문백면 평산리 양성이씨하녀묘지(文白面 平山里 陽城李氏下女墓地) (0) | 2025.03.28 |
| 문백면 평산리 김귀성묘지(文白面 平山里 金貴誠墓地) (0) | 2025.03.28 |
| 문백면 사양리 사양영당(文白面 思陽里 思陽影堂) (0) | 2025.0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