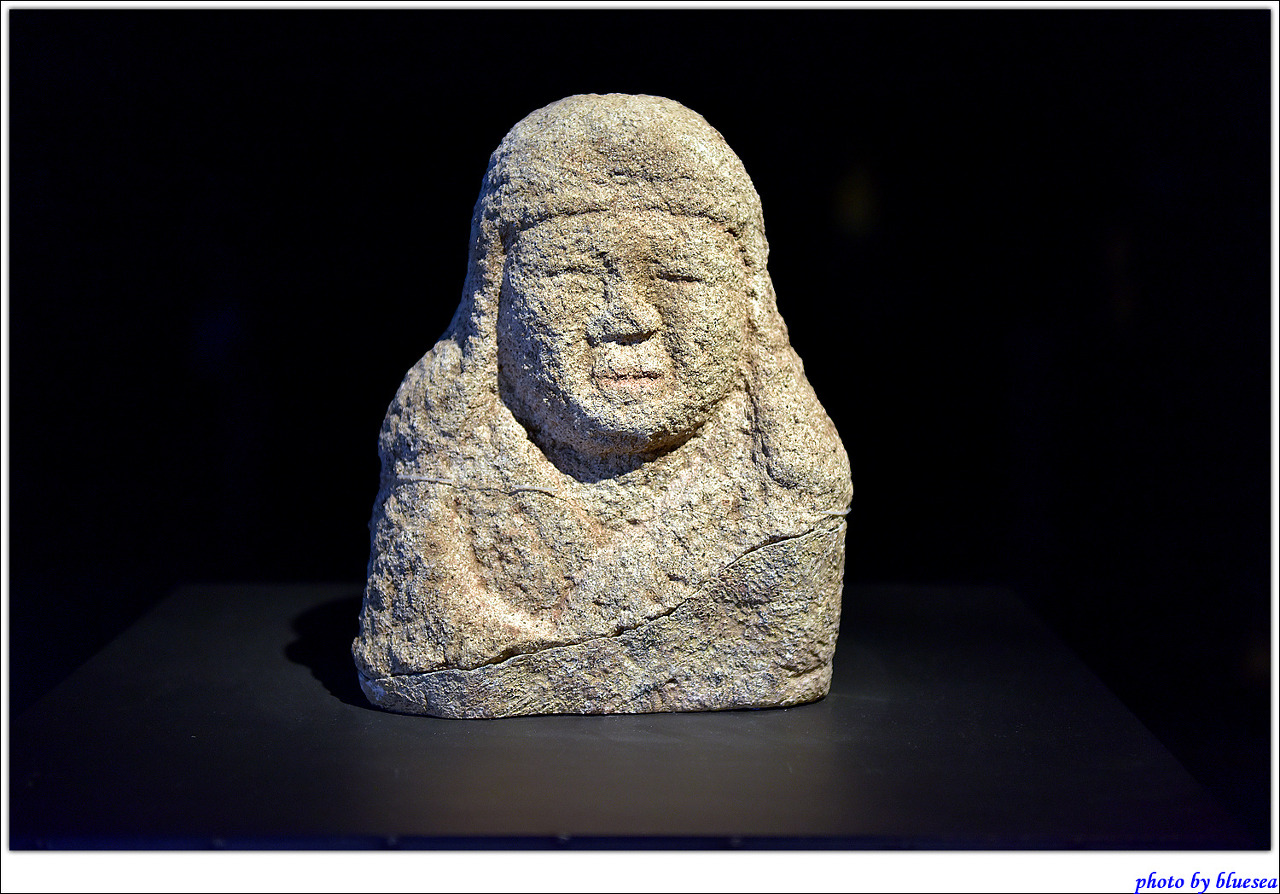|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청풍문화재단지
- 효자문
- 청주박물관
- 경주김씨
- 단지주혈
- 충주박물관
- 각연사
- 화양동 암각자
- 티스토리챌린지
- 곡산연씨
- 공주박물관
- 법주사
- 공산성 선정비
- 사과과수원
- 국립청주박물관
- 오블완
- 한독의약박물관
- 사인암
- 효자각
- 상당산성
- 부도
- 문경새재
- 선돌
- 밀양박씨
- 바람따라 구름따라 가는길
- 화양구곡
- 충북의 문화재
- 부여박물관
- 문의문화재단지
- 보성오씨
- Today
- Total
목록2021/07 (64)
바람따라 구름따라 가는길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 (瑞山 龍賢里 磨崖如來三尊像)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 (瑞山 龍賢里 磨崖如來三尊像)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가야산 계곡을 따라 들어가면 층암절벽에 거대한 여래입상을 중심으로 오른쪽에는 보살입상, 왼쪽에는 반가사유상이 조각되어 있다. 흔히 ‘백제의 미소’로 널리 알려진 이 마애불은 암벽을 조금 파고 들어가 불상을 조각하여 형성되었다. 연꽃잎을 새긴 대좌(臺座) 위에 서 있는 여래입상은 살이 많이 오른 얼굴에 반원형의 눈썹, 살구씨 모양의 눈, 얕고 넓은 코, 미소를 띤 입 등을 표현하였는데, 전체 얼굴 윤곽이 둥글고 풍만하여 백제 불상 특유의 자비로운 인상을 보여준다. 옷은 두꺼워 몸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으며, 앞면에 U자형 주름이 반복되어 있다. 둥근 머리광배 중심에는 연꽃을 새기고, 그 둘레에는 불꽃무늬를 새겼다. 머리에 관(冠)을 쓰고 있는 오른쪽의 보살입상은 얼굴에 본존과 같이 살..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보원사지 석조((瑞山市 雲山面 龍賢里 普願寺址石槽)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보원사지 석조((瑞山市 雲山面 龍賢里 普願寺址石槽)
서산 보원사터에 위치한 석조이다. 보원사는 고란사라고도 하며 사찰에 대한 역사는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1959년 국보 제84호인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이 발견되면서 큰 관심을 끌었던 곳이다. 통일신라시대의 유물로 1963년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석조는 승려들이 물을 담아 쓰던 돌그릇으로, 원형·팔각형·장방형 등이 있다. 이 석조는 화강석의 통돌을 파서 만든 직사각형 모양으로 통일신라시대의 일반적 형식을 보인다. 규모가 거대하며 표면에 아무 장식이 없어 장중해 보인다. 내부 각 면에도 조각한 흔적이 없으며, 밑바닥면은 평평하고 한쪽에 약 8㎝정도의 원형 배수구가 있을 뿐이다. 안쪽과 윗쪽만 정교하게 다듬고 바깥쪽에는 거친 다듬자국이 그냥 남아 있어 땅에 묻어두고 사용했는지도 알수 없다. 조각..
 이천시 설성면 제요리 이창우송덕비(利川市 雪城面 諸蓼里 李昌宇頌德碑)
이천시 설성면 제요리 이창우송덕비(利川市 雪城面 諸蓼里 李昌宇頌德碑)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제요리 도로변에 있는 이창우의 송덕비입니다. 송덕비의 전면에는 송원이창우선생송덕비(松原李昌宇先生頌德碑)라고 적혀있으며 좌우,후면에는 이창우의 송덕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비석은 1998년 마을주민들의 의하여 건립되었습니다.
 산외면 문암리 김천우신도비(山外面 文岩里 金天宇神道碑)
산외면 문암리 김천우신도비(山外面 文岩里 金天宇神道碑)
김천우(金天宇) 1505(연산군 11)~1548(명종 3) │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경주(慶州), 자는 대용(大容)이다. 판도판서 김장유의 7세손이며, 증조는 김처용(金處庸), 할아버지는 판관 김증손(金曾孫), 아버지는 부사직(副司直) 김벽(金碧)이다. 군수 김천부(金天富)의 아우로 보은읍 종곡리에서 출생하였다. 나이 11세에 형 김천부를 따라 종숙(從叔) 충암 김정 문하에 나아가 수학하고, 1528년(중종 23)에 진사시에 합격하였다. 1538년(중종 33) 알성문과(謁聖文科)에 병과로 급제하여 이듬해 홍문관 저작(著作)에 제수되고 이어 부수찬(副修撰)이 되었는데 이때 수찬인 퇴계 이황과 함께 일하였다. 1540년(중종 35)에 사간원 정언(正言)에 제수되고, 이듬해 사헌부 지평(持平)에 제수되..
 서천 성북리 오층석탑 (舒川 城北里 五層石塔)
서천 성북리 오층석탑 (舒川 城北里 五層石塔)
지방적인 특색이 강했던 고려시대의 탑으로, 옛 백제 영토에 지어진 다른 탑들처럼 부여 정림사지 오층석탑(국보 제9호)의 양식을 모방하였는데, 특히 가장 충실히 따르고 있다. 바닥돌 위에 올려진 기단(基壇)은 목조건축의 기둥과 벽과 같이 모서리에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 사이를 판판한 돌을 세워 막았다. 탑신(塔身)은 몸돌을 기단에서처럼 기둥과 벽을 따로 마련하여 세워 놓았는데, 각 면의 모습이 위는 좁고 아래는 넓어 사다리꼴을 하고 있다. 몸돌 위로는 지붕돌을 얹기 전에 지붕받침을 2단 올려놓았는데 그 모습이 정림사지5층석탑을 떠올리게 한다. 1층 몸돌의 각 기둥들이 아래로는 기단을 누르고, 위로는 지붕받침을 이고 있어, 마치 신을 신고 관을 쓰고 있는 모양이다. 지붕돌은 얇고 넓으며 느린 경사를 이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