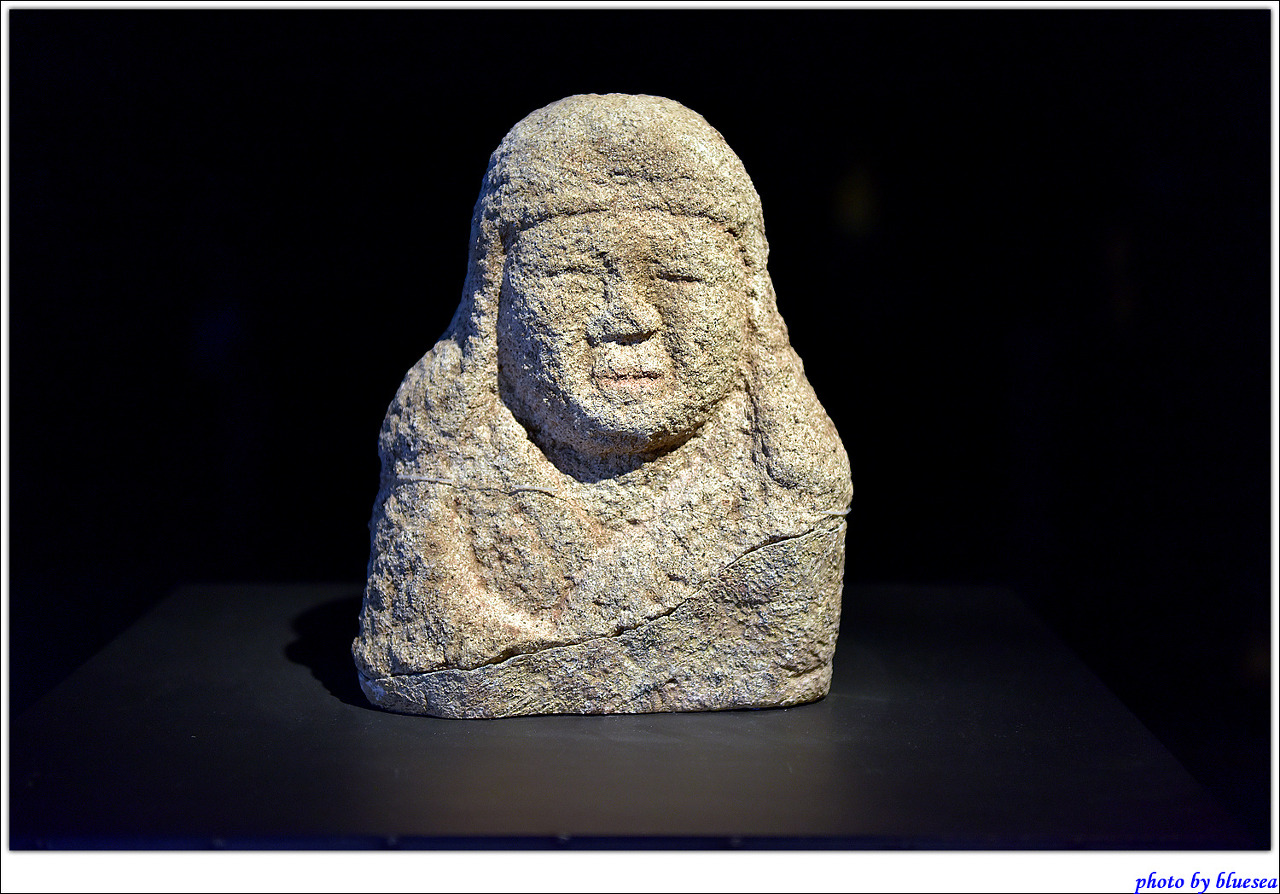|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
| 2 | 3 | 4 | 5 | 6 | 7 | 8 |
| 9 | 10 | 11 | 12 | 13 | 14 | 15 |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 23 | 24 | 25 | 26 | 27 | 28 |
- 오블완
- 바람따라 구름따라 가는길
- 부여박물관
- 효자문
- 문의문화재단지
- 법주사
- 국립청주박물관
- 사인암
- 충북의 문화재
- 청주박물관
- 사과과수원
- 청풍문화재단지
- 문경새재
- 공주박물관
- 보성오씨
- 경주김씨
- 단지주혈
- 밀양박씨
- 화양동 암각자
- 티스토리챌린지
- 화양구곡
- 곡산연씨
- 상당산성
- 선돌
- 각연사
- 효자각
- 부도
- 충주박물관
- 한독의약박물관
- 공산성 선정비
- Today
- Total
목록통합청주시/청원구(淸原區) (219)
바람따라 구름따라 가는길
 북이면 용계리 고분(北二面 龍溪里 古墳)
북이면 용계리 고분(北二面 龍溪里 古墳)
도로를 지나다 언덕에 있는 돌비석이 눈에 띄여 자세히 살펴보아도 확실한 비석의 의미를 모르겠다. 이곳 저곳 궁금하여 인터넷을 뒤지다가 청주시 향토유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는 조금 다른각도의 설명이지만 마음속에 품었던 의문이 조금은 풀리는 듯 하다. 북이면 용계리 고분은 미호천 동안에 형성된 낮은 구릉성 산지에 입지한다. 용계리고분은 기존에 알려져 있지 않았으나, 이번 현지조사결과 지상에 비교적 큰 봉토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삼국시대 또는 중세의 고분일 가능성이 상정된다. 봉토 규모는 직경 약 9m, 높이 2m 정도이다. 용계리고분은 낮은 구릉성산지에 비교적 큰 봉토가 형성된 것으로 보아 일반 민묘와는 다르다. 원형의 봉토 정상에는 나무가 식재되어 있으며, 봉토 가..
 내수읍 세교리 보호수(內秀邑 細橋里 保護樹)
내수읍 세교리 보호수(內秀邑 細橋里 保護樹)
내수읍 세교1리에 있는 보호수입니다. 버드나무로 1982년 보호수로 지정 되었으며 지정당시 추정수령은 약 35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 줄기는 베어지고 가지에서 다시 생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버드나무 아래에는 동네의 쉼터인 정자도 갖추어져 있고 마을회관얖으로는 꽃밭도 조성하고 깨끗하게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내수읍 세교리 발동기(內秀邑 細橋里 發動機)
내수읍 세교리 발동기(內秀邑 細橋里 發動機)
내수읍 세교1리 마을회관앞에 자리하고 있는 발동기입니다. 조양표 발동기로 근처에 정미소등에서 사용하던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요즈음에는 발동기를 전시하는곳이 많습니다. 가덕면 행정리에도 비슷한 발동기를 전시해 놓았습니다.
 북이면 대율리 최명길신도비(北二面 大栗里 崔鳴吉神道碑)
북이면 대율리 최명길신도비(北二面 大栗里 崔鳴吉神道碑)
북이면 대율리에 있는 최명길 신도비이다. 따스한 햇살아래 망초꽃 이불 덥고서 고즈넉히 산새소리에 오수를 즐긴다. 대율리 마을을 지나 이정표따라 길을 재촉하면 만날수 있습니다. 차량도 주차할수 있도록 주차장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최명길은 조선시대 이조판서, 우의정, 영의정 등을 역임한 문신.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자겸(子謙), 호는 지천(遲川)·창랑(滄浪). 최업(崔嶪)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최수준(崔秀俊)이고, 아버지는 영흥부사 최기남(崔起南)이다. 어머니는 참판 유영립(柳永立)의 딸이다. 일찍이 이항복(李恒福) 문하에서 이시백(李時白)·장유(張維) 등과 함께 수학한 바 있다. 1605년(선조 38) 생원시에서 장원하고, 그 해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문원을 거쳐 성균관전적이 되었다. 161..
 낭성면 귀래리 신채호유물관(琅城面 歸來里 申采浩遺物館)
낭성면 귀래리 신채호유물관(琅城面 歸來里 申采浩遺物館)
낭성면 귀래리에 있는 단재신채호선생의 유물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찾는날은 입장이 불가했습니다. 유물관과 함께 단재신채호선생의 영정이 있는 사당과 신채호선생이 태어난 생가터에 조성된 무덤이 있습니다. 또한 영당옆으로는 동상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단재 신채호의 두번째 여인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inews365.com) 단재 신채호의 두번째 여인 나석주(1892~1926) 의사는 항해도 개령 출신으로 1926년 인천을 통해 서울에 잠입, 그해 12월 28일 식산은행에 폭탄을 던져 일본인들을 죽이는 등 맹확약을 한다. 나 의사는 이때가 서울 초행으로 www.inews365.com
 낭성면 귀래리 신채호묘지(琅城面 歸來里 申采浩墓地)
낭성면 귀래리 신채호묘지(琅城面 歸來里 申采浩墓地)
낭성면 귀래리에 있는 단재신채호 선생의 묘역입니다. 묘역에는 근간에 세운 석물인 장명등과 망주석 그리고 문인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재신채호선생의 사적비가 한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장명등은 비단 분묘뿐만 아니라 사찰이나 관가 등의 공공 건축물의 처마 끝에 달거나 마당에 기둥을 세워 불을 밝힐 수 있도록 장치한 등도 장명등이라고 한다. 분묘 앞의 장명등을 일명 석등룡(石燈龍) 혹은 석등(石燈)이라고도 한다. 분묘 앞에 장명등을 세우게 된 시원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분묘제도에 의하면, 분묘 앞에 십이지신상(十二支神像)이나 문무신상(文武神像) 등의 석조물을 세우는 데는 피장자의 신분 혹은 품계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제한하였고, 장명등의 경우는 일품재상(一品宰相)에 한하여 세..